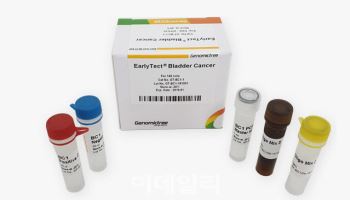“혁신 잠재력 큰 내시경AI ‘웨이메드 엔도’, 성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여러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솔루션이 있지만, 특히 내시경에서는 AI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지현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진단 보조 AI는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한국처럼 내시경을 많이 하는 나라라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시경AI 필요성 높아…정책적 지원·정부 투자 필요
김지현 교수는 2019년 웨이센 설립 당시부터 함께하며 인공지능(AI) 내시경 진단 보조 솔루션인 ‘웨이메드 엔도’의 탄생을 도운 ‘웨이메드 엔도의 어머니’다. 제품 개발 초기 아이템 제안부터 현재 베타버전의 피드백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는 “위암의 침범깊이 확인을 도울 수 있는 AI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위암부터 진단할 줄 아는 의료AI가 필요했다”고 개발 계기를 회상했다.
보통 대장내시경보다 위내시경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메드트로닉의 ‘GI 지니너스’, 올림푸스의 ‘엔도 브레인-아이’는 모두 AI 대장내시경 영상분석 솔루션만 보유하고 있다(국내에는 엔도 브레인-아이만 출시). 웨이센의 1호 제품인 웨이메드 엔도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위와 대장 모두의 내시경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점막층과 점막하층 일부까지 병변이 침범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해 병변의 침범깊이를 파악하는 것은 치료전략 결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시경 초음파를 사용할 때도 침범깊이 판단은 정확도가 높지 않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의사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모양을 보고 침범깊이를 추측하는데 이 역시 정확도가 높지 않다.
김 교수는 “경험많은 내시경 전문의와 웨이메드 엔도의 조기위암 침범깊이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내시경 전문의의 진단정확도는 73.6%, 웨이메드 엔도의 진단정확도는 9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웨이메드 엔도 개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동영상 학습’을 꼽았다. 그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개발하듯 AI내시경 솔루션을 개발할 수는 없었다. CT나 MRI는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데이터가 쌓이는데 내시경은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해야 실시간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의료진에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완성된 웨이메드 엔도를 좀 더 많은 곳에서 쓰고 해외에서도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시경AI 솔루션의 기술력이 높아지려면 의료데이터, 내시경 의사의 능력, AI 기술력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셋 모두 한국이 글로벌 선두에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지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것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위양성률과 민감도는 상충관계…의사-AI 소통 중요”
AI와 의료계가 함께 성장하려면 의료진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AI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의료AI는 주로 병변을 짚어주는 용도로 개발되는데 진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위양성률(False Positive)을 낮출수록 민감도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의 잦은 섭취,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으로 위 점막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위양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위암 환자가 드물테니 위양성률이 높으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AI솔루션의) 위양성률을 줄이면 민감도가 감소할 수 있어 정말 병변이 나타났을 때 이걸 탐지할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며 “의료진은 검사 기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AI 솔루션이 ‘기본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으로 설명형 AI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AI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솔루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보여줬을 때 확실히 의사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와 AI 사이 소통을 용이한다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시경 AI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것을 가짜경고(False Alarm)로 치부하고 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맹신해도 문제고, 아예 무시해도 문제죠. 그러니 양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설명형 AI를 도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도구’예요. AI에 너무 환상을 갖지도, 폄하하지도 말고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보조기구라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지현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진단 보조 AI는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한국처럼 내시경을 많이 하는 나라라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내시경AI 필요성 높아…정책적 지원·정부 투자 필요
김지현 교수는 2019년 웨이센 설립 당시부터 함께하며 인공지능(AI) 내시경 진단 보조 솔루션인 ‘웨이메드 엔도’의 탄생을 도운 ‘웨이메드 엔도의 어머니’다. 제품 개발 초기 아이템 제안부터 현재 베타버전의 피드백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는 “위암의 침범깊이 확인을 도울 수 있는 AI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위암부터 진단할 줄 아는 의료AI가 필요했다”고 개발 계기를 회상했다.
보통 대장내시경보다 위내시경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메드트로닉의 ‘GI 지니너스’, 올림푸스의 ‘엔도 브레인-아이’는 모두 AI 대장내시경 영상분석 솔루션만 보유하고 있다(국내에는 엔도 브레인-아이만 출시). 웨이센의 1호 제품인 웨이메드 엔도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위와 대장 모두의 내시경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점막층과 점막하층 일부까지 병변이 침범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해 병변의 침범깊이를 파악하는 것은 치료전략 결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시경 초음파를 사용할 때도 침범깊이 판단은 정확도가 높지 않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의사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병변의 모양을 보고 침범깊이를 추측하는데 이 역시 정확도가 높지 않다.
김 교수는 “경험많은 내시경 전문의와 웨이메드 엔도의 조기위암 침범깊이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내시경 전문의의 진단정확도는 73.6%, 웨이메드 엔도의 진단정확도는 9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웨이메드 엔도 개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동영상 학습’을 꼽았다. 그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개발하듯 AI내시경 솔루션을 개발할 수는 없었다. CT나 MRI는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데이터가 쌓이는데 내시경은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해야 실시간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의료진에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렇게 완성된 웨이메드 엔도를 좀 더 많은 곳에서 쓰고 해외에서도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시경AI 솔루션의 기술력이 높아지려면 의료데이터, 내시경 의사의 능력, AI 기술력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셋 모두 한국이 글로벌 선두에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지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것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위양성률과 민감도는 상충관계…의사-AI 소통 중요”
AI와 의료계가 함께 성장하려면 의료진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AI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의료AI는 주로 병변을 짚어주는 용도로 개발되는데 진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위양성률(False Positive)을 낮출수록 민감도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일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의 잦은 섭취,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으로 위 점막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위양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위암 환자가 드물테니 위양성률이 높으면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AI솔루션의) 위양성률을 줄이면 민감도가 감소할 수 있어 정말 병변이 나타났을 때 이걸 탐지할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며 “의료진은 검사 기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AI 솔루션이 ‘기본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I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으로 설명형 AI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AI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솔루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보여줬을 때 확실히 의사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와 AI 사이 소통을 용이한다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시경 AI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것을 가짜경고(False Alarm)로 치부하고 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맹신해도 문제고, 아예 무시해도 문제죠. 그러니 양자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설명형 AI를 도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도구’예요. AI에 너무 환상을 갖지도, 폄하하지도 말고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보조기구라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은경 eeee@









![김경민 용인세브란스 교수 "GLP-1 비만약, 복합제보다 투약 주기 관건"[전문가 인사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301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