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일부러 ‘피하고 싶은 기관’으로 이미지를 다지고 있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작위로 평가기관을 배정받는 기술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곳을 피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현금거래 기록을 만들어 이해상충 관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빈발하는 현상이다. 일명 모의고사 형태의 ‘예비평가’다. 일각에서는 평가기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일부러 기업에 낙제점을 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술평가 기관들이 수익성을 위해 바이오 기술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술평가점수로 BB 또는 BBB를 많이 주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세워, ‘예비 기술평가’ 또는 ‘기술평가서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곤 한다. 현금이 오고 간 사이를 구축해 의도적으로 ‘이해상충(COI)’을 만들어 정식 기술성 평가에서는 심사기관에서 피해가는 방책이다. 예비 기평의 경우 정식 기평보다 값은 더 비싼 반면 평가기관에 부과되는 책임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정식 기술평가는 2000만원이지만, 모의 평가는 4000만원이다. 나아가 기술소개서 대필 서비스는 1억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평가기관에 몸 담았던 한 업계 관계자는 “7개 기술성 평가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제외하고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6곳 모두 해당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도덕성이 높아 안하는게 아니라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적 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기관이 모의평가 및 사업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파악된다. 당시 N사가 처음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했고 출시과정에서 거래소 측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시작은 기술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며 변질됐다. 나머지 기술성 평가기관들도 줄지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이 시작됐다. 금액도 초기에는 현재 수준보다 저렴했지만 경쟁이 과열되며 대폭 올랐다.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영업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다면 상장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기술력보다는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평가기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 ‘복불복’이라는 점도 압박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이루려면 거래소가 무작위로 배정한 두 곳의 평가기관에서 A, BBB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한 곳에서 A를 받았다면 나머지 한 곳에서 반드시 BBB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 이후 예비심사 청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번 기술평가에 낙방하면 6개월이 지나야 재도전할 수 있다. 바이오 연구개발사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의 기로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때문에 낙제점을 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소문난 기관을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모의평가를 신청한다는 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기술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건 학교 선생님이 개인과외를 해주는 셈이다. 껄끄러운 기관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갑을 여는데, 문제가 크다.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불만들이 많다. 실제로 문제가 커지면 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망가지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바이오텍 대표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지적한다고 해서 개선(善)은 없고 개악(惡)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평가기관을 배정받는 기술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곳을 피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현금거래 기록을 만들어 이해상충 관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빈발하는 현상이다. 일명 모의고사 형태의 ‘예비평가’다. 일각에서는 평가기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일부러 기업에 낙제점을 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술평가 기관들이 수익성을 위해 바이오 기술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기술평가점수로 BB 또는 BBB를 많이 주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세워, ‘예비 기술평가’ 또는 ‘기술평가서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곤 한다. 현금이 오고 간 사이를 구축해 의도적으로 ‘이해상충(COI)’을 만들어 정식 기술성 평가에서는 심사기관에서 피해가는 방책이다. 예비 기평의 경우 정식 기평보다 값은 더 비싼 반면 평가기관에 부과되는 책임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정식 기술평가는 2000만원이지만, 모의 평가는 4000만원이다. 나아가 기술소개서 대필 서비스는 1억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평가기관에 몸 담았던 한 업계 관계자는 “7개 기술성 평가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제외하고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6곳 모두 해당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도덕성이 높아 안하는게 아니라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적 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작은 기술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며 변질됐다. 나머지 기술성 평가기관들도 줄지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이 시작됐다. 금액도 초기에는 현재 수준보다 저렴했지만 경쟁이 과열되며 대폭 올랐다.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영업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다면 상장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기술력보다는 현금 창출력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평가기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 ‘복불복’이라는 점도 압박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이루려면 거래소가 무작위로 배정한 두 곳의 평가기관에서 A, BBB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한 곳에서 A를 받았다면 나머지 한 곳에서 반드시 BBB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 이후 예비심사 청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번 기술평가에 낙방하면 6개월이 지나야 재도전할 수 있다. 바이오 연구개발사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의 기로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때문에 낙제점을 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소문난 기관을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모의평가를 신청한다는 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기술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건 학교 선생님이 개인과외를 해주는 셈이다. 껄끄러운 기관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갑을 여는데, 문제가 크다.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불만들이 많다. 실제로 문제가 커지면 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망가지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바이오텍 대표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지적한다고 해서 개선(善)은 없고 개악(惡)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정요 기자 kayla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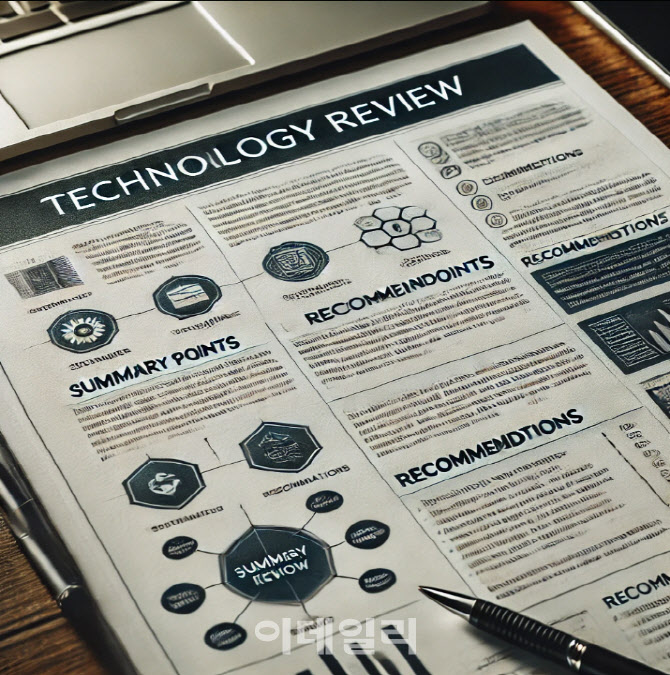





![한국형 특화전략을 구사하자[바이오, 해외에 답 있다]④](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2/PS25022101038b.jpg)
!['무상감자' 클리노믹스·비엘팜텍, 上...광동헬스바이오도 상승세[바이오맥짚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2/PS25022100239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