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 인허가 제도개혁…2027년 바이오기술법으로 지각변동 예고
[빌뉴스(리투아니아)=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미국과 중국에 대응할 유럽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27개 유럽연합(EU) 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 간소화와 일원화가 시급하다. 앞으로 2027년까지 바이오기술법(BioTech Act) 제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하에 해외사들의 유럽시장 진입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라이프사이언스 발틱스 2025(LSB 2025)에서는 유럽지역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토론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작년 7월 제기된 바이오기술법에 대한 내용으로, 유로파바이오(EuropaBio)가 이와 관련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로파바이오는 1996년 설립된 유럽 바이오산업 협회로, 헬스케어 산업에 유의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유럽연합 의사결정 기구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유럽연합 바이오기술법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럽의 진화와 혁명’을 주제로 연단에 선 클레어 스켄텔베리(Claire Skentelbery) 유로파바이오 총장은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의약품 인허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유지한 채로, 인허가 과정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장의 인허가 제도가 분절되어 있는 불편함도 개선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스켄텔베리 총장은 “단순히 독일과 프랑스의 규제가 다른 정도가 아니다. 독일 내부 지역 간에도 서로 다른 시장 진입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야만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기술법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가치사슬을 정비하고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제도로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스켄텔베리 총장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만큼 리투아니아의 우선순위와 성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연단에 선 크리스틴 톰슨(Kristin Thompson) 메히유파트너스(Merieux Partners) 혁신투자 디렉터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유럽지역 인허가 제도에 대해 말했다.
톰슨 디렉터는 “유럽에서 인허가를 받는 것은 미국 대비 6개월이 더 소요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비선호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이 곧 의약품의 특허기간 축소, 즉 시장 독점기간 단축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보험수가 확보도 복잡해 판매고점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투자자에겐 투자회수(ROI)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제약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오늘날 유럽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비상태”라며 “겹겹이 규제와 회원국 체계 뒤에 숨어 있다. 바이오기술법이 입법되면 더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톰슨 디렉터는 전날 ‘새롭게 부상하는 생명과학 트렌드: 다음은 무엇인가?’ 세션에도 참석해 “유럽지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디리스킹(De-risking)이 중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신규 모달리티에 대해 비인간 영장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채로 인체검증에서는 약물의 효능을 살피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과 약물의 안전성 프로파일 증진 방안도 활발히 탐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약개발에 AI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내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AI가 실수하는 만큼 사람 또한 실수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한편, 바이오기술법 입법으로 유럽내 의약품 인허가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오기술법이 외국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톰슨 디렉터는 “더 효능이 좋거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이 인허가 된다면 유럽에 좋은 일”이라며 “데이터만 갖췄다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라이프사이언스 발틱스 2025(LSB 2025)에서는 유럽지역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토론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작년 7월 제기된 바이오기술법에 대한 내용으로, 유로파바이오(EuropaBio)가 이와 관련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날 ‘유럽연합 바이오기술법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럽의 진화와 혁명’을 주제로 연단에 선 클레어 스켄텔베리(Claire Skentelbery) 유로파바이오 총장은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의약품 인허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유지한 채로, 인허가 과정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장의 인허가 제도가 분절되어 있는 불편함도 개선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스켄텔베리 총장은 “단순히 독일과 프랑스의 규제가 다른 정도가 아니다. 독일 내부 지역 간에도 서로 다른 시장 진입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야만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기술법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가치사슬을 정비하고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제도로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도전하는 이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스켄텔베리 총장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만큼 리투아니아의 우선순위와 성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톰슨 디렉터는 “유럽에서 인허가를 받는 것은 미국 대비 6개월이 더 소요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비선호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이 곧 의약품의 특허기간 축소, 즉 시장 독점기간 단축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보험수가 확보도 복잡해 판매고점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투자자에겐 투자회수(ROI)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제약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오늘날 유럽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비상태”라며 “겹겹이 규제와 회원국 체계 뒤에 숨어 있다. 바이오기술법이 입법되면 더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톰슨 디렉터는 전날 ‘새롭게 부상하는 생명과학 트렌드: 다음은 무엇인가?’ 세션에도 참석해 “유럽지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디리스킹(De-risking)이 중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신규 모달리티에 대해 비인간 영장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채로 인체검증에서는 약물의 효능을 살피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과 약물의 안전성 프로파일 증진 방안도 활발히 탐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약개발에 AI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내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AI가 실수하는 만큼 사람 또한 실수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한편, 바이오기술법 입법으로 유럽내 의약품 인허가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오기술법이 외국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톰슨 디렉터는 “더 효능이 좋거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이 인허가 된다면 유럽에 좋은 일”이라며 “데이터만 갖췄다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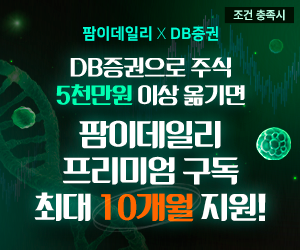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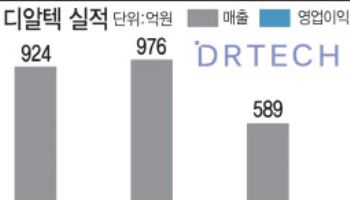
![[옥석 가리는 AI의료]김영웅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격변의 시대, 역량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9/PS25091900570b.jpg)
![[옥석 가리는 AI의료]루닛 이후 2세대 기업도 1조 클럽 가능…뜨는 다크호스는](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9/PS25091700167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