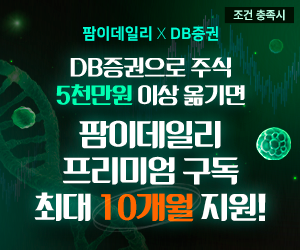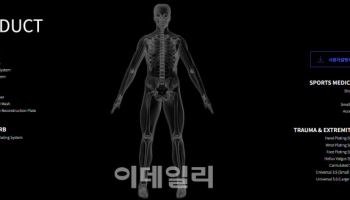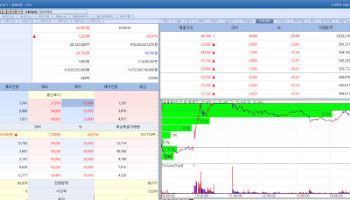[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여러번 창업 후 경영권 매각도 해보고 상장도 해보고 나니까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김동호 엔에이백신연구소(NAVI) 대표는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NAVI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RNAi 전문가, 면역증강제에 눈 돌린 이유
김 대표는 국내외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경희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했다. 이후 시티 오브 호프 국립연구소(City of Hope National Research Institute)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 스태프 사이언티스트(Staff Scientist), RNA 간섭 핵심 디렉터(RNAi core director)를 역임했다.
이후 김 대표는 미국에서 RNAi 기술을 활용해 2004년 셀레넥스를 창업하고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사로 매각했다. 한국에서는 2006년 제놀루션(225220)을 공동 창업해 2015년 코넥스 상장 후 지분을 매각했다. RNAi 기술로 치료제를 개발한 뒤 앨라일람, 다이서나에 각각 2004년과 2005년 기술수출한 경험도 있다.
이력상으로는 RNAi 전문가인 김 대표가 면역증강제 기술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RNAi 기술은 신약개발에 혁신적이지만 일부 간 전달에만 효과를 보이는 등 타깃하는 체내 장기나 세포 전달 기술에 한계가 있다”며 “편식하려고 도망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게 지쳐갈 쯤 적절한 자극만 있으면 스스로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에 주목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면역 반응에 필수적인 면역증강물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김 대표는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제 ‘넥사번트’(Nexavant) 기반 백신과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 2월 엔에이백신연구소를 설립했다. NAVI가 창업 8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 無…“완성도가 우선”
김 대표는 “임상 진입 속도만을 위해 퀄리티 떨어지는 면역증강물질을 개발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순간의 오판이 있었다면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임상을 진행하며 자금이 고갈되고 부족한 임상 자료를 갖고 품팔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상 속도에 쫓겨 완성도가 낮은 물질을 내놓고 싶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NAVI의 면역증강물질은 2021년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2차 개발물질이 기존 물질보다 약 10배 개선 효과를 보이자 임상 준비를 2023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프로토타입 대비 약 1000배의 유효성을 보이는 최종 물질을 완성해 비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내부 검증을 철저히 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느라 임상개발 속도가 더뎌졌다는 얘기다.
NAVI는 2021년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친 뒤 현재까지 추가 자금 유치 없이 운영해온 비상장사다. 누적 투자 유치금은 240억원이며, 8년간 연구 관련 투자비로 230억원을 지출했다. 김 대표는 “정부 과제를 통해 100억원 이상 지원받았다”며 “아직 임상개발자금으로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패한 연구 90%가 10%의 개발 성공을 떠받친다는 확신을 갖고 연구개발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연간 30억원씩 쓰면서 여태까지 후보물질 개발과 전임상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한 긴축 재정이다. 이 같은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임상시료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임상시료로 다양한 적응증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비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논문 기반 신뢰 확보 뒤 기술이전 전략
NAVI의 사업개발 전략은 탄탄한 논문 작업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신뢰를 형성한 뒤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NAVI는 지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에 이어 올해는 NPJ 백신즈(NPJ Vaccines)에 논문 2편을 게재하는 등 이날 기준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올해 2편의 논문을 추가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목표이다.
아직 NAVI의 기술이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온 측면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학술 성과에서 사업성 증명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 과제이다. 앞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통해 외부 재현성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효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상포진 백신, 암 전이 억제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임상 자금 마련을 위해 내년에 200억~300억원 규모의 프리IPO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7년 초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다.
|
RNAi 전문가, 면역증강제에 눈 돌린 이유
김 대표는 국내외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경희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했다. 이후 시티 오브 호프 국립연구소(City of Hope National Research Institute)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 스태프 사이언티스트(Staff Scientist), RNA 간섭 핵심 디렉터(RNAi core director)를 역임했다.
이후 김 대표는 미국에서 RNAi 기술을 활용해 2004년 셀레넥스를 창업하고 2년 만에 나스닥 상장사로 매각했다. 한국에서는 2006년 제놀루션(225220)을 공동 창업해 2015년 코넥스 상장 후 지분을 매각했다. RNAi 기술로 치료제를 개발한 뒤 앨라일람, 다이서나에 각각 2004년과 2005년 기술수출한 경험도 있다.
이력상으로는 RNAi 전문가인 김 대표가 면역증강제 기술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RNAi 기술은 신약개발에 혁신적이지만 일부 간 전달에만 효과를 보이는 등 타깃하는 체내 장기나 세포 전달 기술에 한계가 있다”며 “편식하려고 도망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게 지쳐갈 쯤 적절한 자극만 있으면 스스로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에 주목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면역 반응에 필수적인 면역증강물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김 대표는 자체 개발한 면역증강제 ‘넥사번트’(Nexavant) 기반 백신과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 2월 엔에이백신연구소를 설립했다. NAVI가 창업 8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 無…“완성도가 우선”
김 대표는 “임상 진입 속도만을 위해 퀄리티 떨어지는 면역증강물질을 개발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순간의 오판이 있었다면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임상을 진행하며 자금이 고갈되고 부족한 임상 자료를 갖고 품팔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상 속도에 쫓겨 완성도가 낮은 물질을 내놓고 싶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NAVI의 면역증강물질은 2021년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2차 개발물질이 기존 물질보다 약 10배 개선 효과를 보이자 임상 준비를 2023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프로토타입 대비 약 1000배의 유효성을 보이는 최종 물질을 완성해 비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내부 검증을 철저히 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느라 임상개발 속도가 더뎌졌다는 얘기다.
NAVI는 2021년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친 뒤 현재까지 추가 자금 유치 없이 운영해온 비상장사다. 누적 투자 유치금은 240억원이며, 8년간 연구 관련 투자비로 230억원을 지출했다. 김 대표는 “정부 과제를 통해 100억원 이상 지원받았다”며 “아직 임상개발자금으로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패한 연구 90%가 10%의 개발 성공을 떠받친다는 확신을 갖고 연구개발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연간 30억원씩 쓰면서 여태까지 후보물질 개발과 전임상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바이오벤처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한 긴축 재정이다. 이 같은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임상시료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임상시료로 다양한 적응증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비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논문 기반 신뢰 확보 뒤 기술이전 전략
NAVI의 사업개발 전략은 탄탄한 논문 작업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신뢰를 형성한 뒤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NAVI는 지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에 이어 올해는 NPJ 백신즈(NPJ Vaccines)에 논문 2편을 게재하는 등 이날 기준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올해 2편의 논문을 추가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목표이다.
아직 NAVI의 기술이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온 측면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학술 성과에서 사업성 증명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 과제이다. 앞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통해 외부 재현성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효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상포진 백신, 암 전이 억제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임상 자금 마련을 위해 내년에 200억~300억원 규모의 프리IPO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7년 초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다.